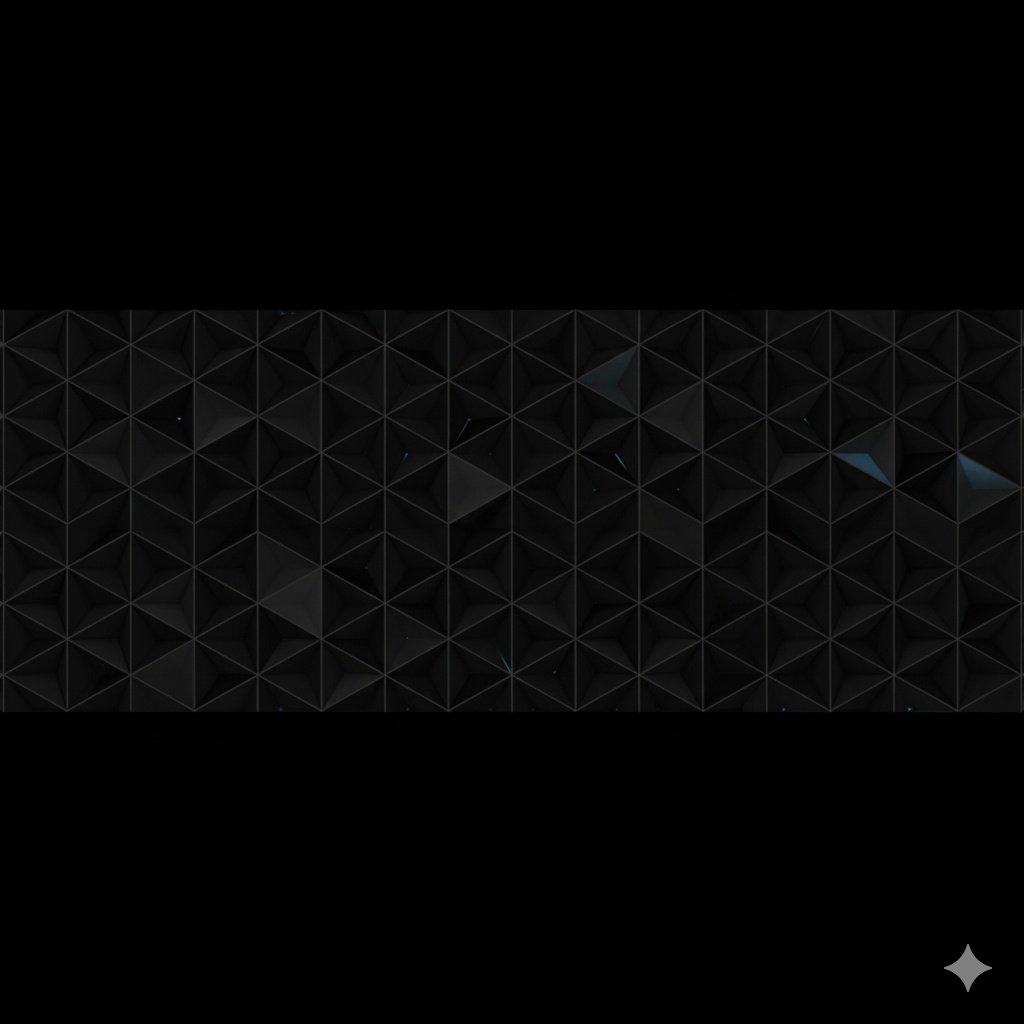
We are busy, but not effective

긴급한 일이 조직을 지배할 때, 조직의 성장을 만드는 중요한 일은 사라진다.
1. 바쁜데도 조직은 나아가지 않는다
바쁘게 일하는데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모두가 하루 종일 업무에 치여 있는데도 성과는 지지부진하고, 고객의 불만은 반복된다. 기획은 반복되고, 회의는 더 많아지고, 문제는 다음 달에도 그대로다.
이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리더나 구성원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이걸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건 다음에 하자.”
이 말 속에는 조직을 지배하는 정서가 있다. 바로 '긴급함(Urgency)'이다. 긴급한 일이 늘 중요한 일을 밀어낸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중요한 문제는 계속 미뤄진다. 결국 조직은 꺼야하는 불을 해결하는 ‘소방’ 중심의 일처리 구조에 익숙해지고, 불이 날 때만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조직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하는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되고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점점 ‘일이 끌고 가는 조직’이 된다.
2. 긴급함의 정체는 무계획과 무전략이다
대부분의 긴급한 일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사실 예측 가능했던 일이 대부분이다. 고객의 이탈, 기능의 오류, 반복되는 운영 이슈는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고, 전략이 없다면 이미 경험한 일임에도 이 문제들은 매번 새로운 위기로 다가온다.
무계획은 긴급함을 만든다. 전략 없는 목표는 늘 일정 지연과 리소스 부족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 결국 팀은 긴급한 일에만 반응하고, 중요한 일은 ‘한가할 때’로 미뤄진다. 그런데 조직에서 한가한 때란 없다. 성장하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한가한 때는 절대 오지 않으며 한가한 때가 온다는 것은 성장이 없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긴급한 일은 시스템이 부재하는 한 절대 끝나지 않고, 중요한 일은 시작되지 않는다.
3. 리더의 가장 큰 착각은 '긴급함을 해소하는 것'이다
많은 리더들은 팀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리더는 해결사를 자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필요성과 성과를 증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회의 중에 갑자기 사소한 버그 수정이나, 프로모션 배너 검토 요청이 오면 빠르게 직접 대응한다. 빠른 대응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해주는 것에 스스로의 역할에 만족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잘못된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리더가 긴급한 일을 대신해주는 구조는, 팀의 전략적 사고를 멈추게 만든다.
리더는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직이 ‘긴급함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리더다.
4. 긴급함을 멈추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
중요한 일은 늘 긴급한 일에 밀린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대부분 ‘긴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목표 수립, 팀구조 설계, 고객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 제품 구조 리디자인, 인재 육성 등
이런 일들은 오늘 당장 하지 않아도 큰일은 나지 않는다. 한가한 때를 기다리며 하지만 하지 않으면, 조직은 계속 긴급한 일만 하게 된다. 구조가 없으면, 조직은 긴급한 일로 채워진다.
긴급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는다. 긴급함을 줄인다는 것은 곧, 중요한 일을 구조적으로 우선순위를 높이고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리더는 ‘중요한 일은 나중에’라는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
1) 우선순위가 아닌, 우선구조를 만든다
많은 조직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 결과 긴급한 일이 나타날 때마다 중요한 일은 밀려난다.
우선순위란 리더의 말이 아니라, 시간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떤 구조로 논의하고 실행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은 사라진다.
2) 긴급함을 설계로 레버리지한다
대부분의 긴급한 일은 반복된다. 고객 문의, 버그, 운영 이슈, 사소한 요청들까지.
이런 일은 사라지지 않지만, 반복을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면 긴급함은 레버리지된다.
반복되는 이슈는 자동화하거나 템플릿화해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예측 가능한 리스크는 운영 매뉴얼과 의사결정 기준을 통해 사전에 차단한다.
‘누구나 대응 가능’한 문제는 ‘누구만’ 대응하게 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긴급함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의 실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