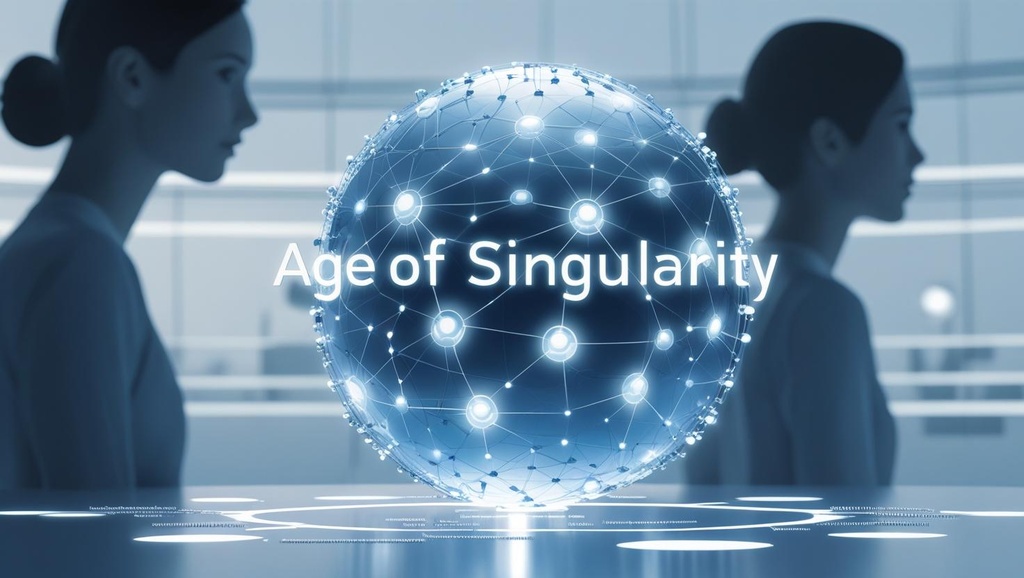
특이점의 시대, 조직문화는 살아남는가
'특이점의 시대(Age of Singularity)'는 1950년대 수학자 존 폰 노이만이 "기술의 가속화하는 진보가 인류 역사상 어떤 본질적 특이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한 개념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AI가 인간의 삶과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의미하는데요.
수많은 채널을 통해 AI 관련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 업데이트가 쏟아지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특이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집단’이 사라지는 시대
에드가 샤인 교수가 조직문화를 ‘특정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이라고 정의하듯, 조직문화의 기본 단위는 ‘집단’입니다. L&D가 구성원 개인의 개발에 포커싱한다면, 조직문화의 담론은 ‘집단’을 전제로 전개됩니다.
‘집단’의 변화관리의 지향점을 설정하고(MVC), ‘집단’의 기본 가정을 탐색하며(진단), 변화관리(혹은 MVC의 내재화)를 위한 각종 인터벤션을 진행해(이벤트, 워크숍, 교육 등), 기본 가정을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Human Worker를 기본 단위로 하며, 기본적으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은 유사한 능력치를 갖고 있으며, 유사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포용’이라는 가치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AI의 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전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먼저, AI Worker의 등장입니다. 생성형AI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The Year the Frontier Firm is Born(2025)>에서 예견한 ‘인간-에이전트팀’의 등장이 그리 먼 미래가 아님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직무간 경계가 없어지는 지금,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앱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UX 디자이너 모두가 필요했고, 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홀로 모든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HR 담당자가 사내홍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내 PR팀과 협의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혼자 가능하게 되었죠. 내 생각을 타인과 교류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로덕트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던, Communication Cost를 줄이기 위해 진행했던 회의 문화 개선 담론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두 번째, 모든 구성원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포용적 ‘가정’의 흔들림입니다. 타운홀 미팅, OKR, DEI, 온보딩. 이 모든 아이템의 전제에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정’이 있고, 이 가정의 이면에는 “어차피 우리 조직에 있는 한, 업무 수준에 특출난 성과 차이가 없어”라는 숨겨진 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AI가 고성과 인력과 저성과 인력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보 수단의 발달(인스타)이 맛집 웨이팅 문화를 만들며 F&B 시장에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듯이 말이죠. 조직내 개인간 생산성의 차이가 심화된다고 할 때, 개인 각각의 의견이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