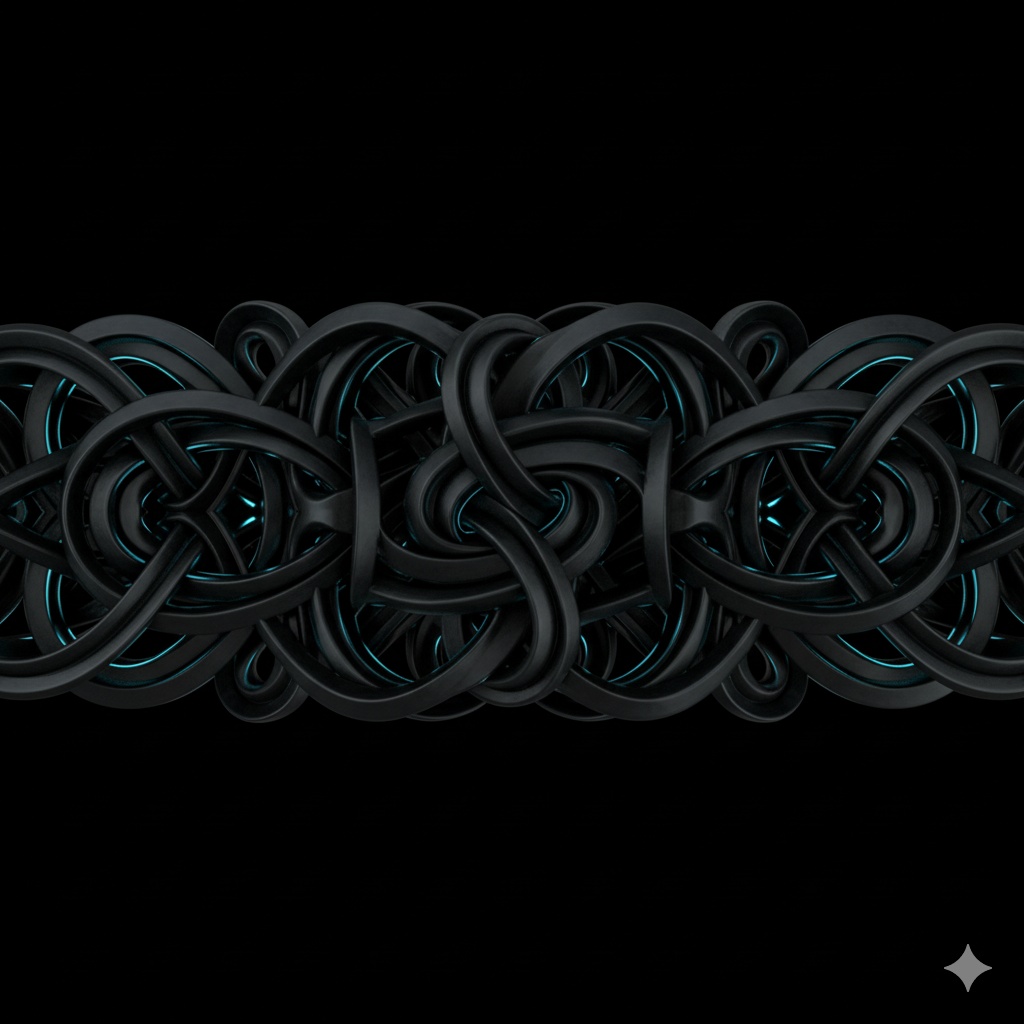
The Scaling Paradox: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결과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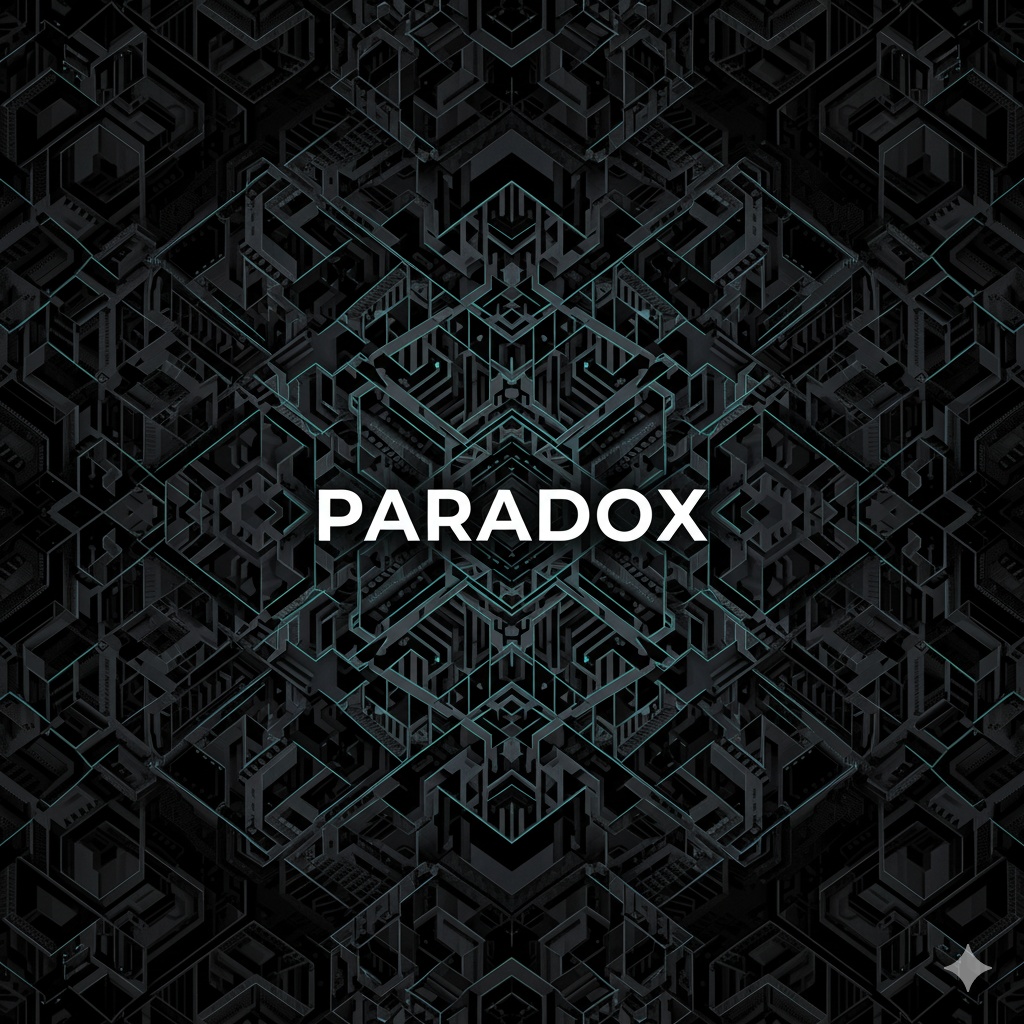
1.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결과를 만든다
스타트업의 성장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시장에서 제품의 가능성이 입증되고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더 많은 사람”만 있다면 더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채용은 속도를 위한 수단이 되고, 리더는 기민한 대응을 위해 인력을 빠르게 확장한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실행 속도는 느려지고, 책임은 모호해지고, 의사결정은 복잡해진다. 고객의 피드백이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크고 작은 오류는 매일 반복된다. 결국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결과를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스케일링 패러독스(Scaling Paradox)다. 성장하기 위해 인력을 늘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과 실행력이 무너지는 현상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몇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단기간의 규모 확대로 인해 실패한 사례 즉 이 같은 구조 없는 성장은 심각한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현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1년차 폐업률은 35.2%, 5년차 폐업률은 66.2%에 달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최근 3년 기준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았으나 위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 ]

*비상장 스타트업상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 혁신의숲 데이터 참고
이들 기업은 투자유치에 힘입어 단기간에 인력을 대거 채용했으나,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빠르게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리더십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질서와 혼란이 커지고, 이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2. 초기의 성공공식은 오래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작은 팀, 빠른 실행, 직접 소통’이라는 성공공식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초기에는 리더가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고, 팀원들은 서로의 일에 깊이 관여하며 속도감 있게 일한다. 회의도, 보고도, 절차도 최소화되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된다.
하지만 이 공식은 팀이 커지면 무너진다. 인력이 늘어나면 소통해야할 대상이 너무 많아지거나 의사결정의 위계가 생기면서 직접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모든 일을 리더가 파악하고 통제하기도 어렵다. 각자 맡은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책임은 흩어진다. 그 결과, 이전에는 ‘잘 굴러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빠른 성장을 만든 공식이 규모가 커진 성장한 조직에겐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타트업이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초기보다 상대적으로 큰 팀, 느린 실행, 간접 소통이 되면서
비교우위로 가지던 민첩하고 빠른 성장방식은 사라지고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변화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변모해간다.
3. 구조 없는 성장의 대가는 너무 크다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시스템과 구조도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사람만’ 늘리는 데 집중하느라, 구조 설계는 나중으로 미룬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이 느려진다. 누가 결정권자인지 명확하지 않고, 수많은 피드백과 논의를 거치느라 실행이 지연된다.
역할이 중첩되거나 비어 있다. 누가 어떤 문제를 책임지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이 떠돌아다닌다.
조직 간 충돌이 잦아진다. 우선순위와 목표 정렬이 사라지면서, 협업이 아닌 충돌이 일상화된다.
결국 조직은 속도를 잃고, 성과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리더는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지만, 실제 원인은 구조에 있다.
인력 확장의 문제는 단지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노암 와서만(Noam Wasserman) 교수는 1만 명 이상의 창업자를 분석한 연구에서 스타트업 실패의 65%가 인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역량이 부족한 잘못된 인력 충원” 때문만이 아니다. 조직원 간의 갈등, 역할 혼란, 의사결정 충돌, 그리고 보상 체계의 불균형 등 다양한 HR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초기의 팀워크와 실행력을 이끌던 긴밀한 협업은 조직이 커지며 갈등으로 전환되기 쉽다. 특히, 초기 구성원 간 명확하지 않은 권한과 책임, 빠르게 급변하는 역할 변화, 성과에 대한 기대치의 불일치가 겹치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다. 이는 팀의 동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결국 이직률 증가, 내부 갈등, 전략 실행력의 붕괴로 이어진다.
결국, 인력의 문제는 ‘채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인력 성장의 전제가 되는 역할 설계, 권한 위임, 보상 철학이 부재할 때 스타트업은 조직으로서 무너진다.
4.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설계’다
채용은 성장의 해답이 아니다. 사람을 더 뽑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일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구조 없는 채용은 결국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 리더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
1) 일의 책임과 흐름을 재정의하라
역할은 조직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흐름에서 작동해야 한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업무는 단위 기능이 아니라 고객 문제 해결의 흐름을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2) 정보 흐름과 의사결정을 시스템화하라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생기는 문제는 정보의 단절이다. 이때 필요한 건 더 많은 회의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이다.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결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구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반복되는 논의는 프로세스로 치환되어야 한다.
3) 팀이 아닌 일의 단위로 조직을 설계하라
조직은 부서나 직무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단위로 설계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의 크로스펑셔널 구조, 고객 여정을 기준으로 한 팀 구성,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유동적 리소스 배분 등 ‘일을 중심으로 설계된 조직’만이 스케일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시스템은 구성원이 아닌 리더의 책임이다. 일은 사람보다 먼저 설계되어야 한다.
5. 성장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스타트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손대는 해법은 사람이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더 뽑고, 문제가 터지면 담당자를 교체하며, 팀이 느려지면 중간관리자를 추가한다. 겉으로는 실행력 있는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인건비와 더 복잡한 조직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람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팀이 비효율적이라면, 그건 팀원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업무 설계와 흐름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복되는 이직과 채용, 성장 없는 확장은 대부분 구조의 실패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스타트업이 투자 이후 빠르게 조직을 확장하지만, 그 속도만큼 구조를 정비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이직률 증가, 커뮤니케이션 병목, 리더의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리더가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메가 리더’ 구조는 오히려 조직의 병목이 된다.
1)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면 좋은 일’로 분산되는 조직
스타트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중요해 보이고, 모든 요청이 긴급해 보이기 때문에 리더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겪는 문제는 일의 부족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부재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중요해 보여”라는 흐릿한 전략 아래선 어떤 인력도 성과를 낼 수 없다.
분명한 우선순위란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의미한다.
이 기준 없이 확장된 조직은 모든 일을 ‘긴급’하게 만들고, 그 긴급함은 곧 무계획한 채용으로 이어진다.
2) 채용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책임을 만든다
많은 리더가 채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채용은 ‘해결’이 아닌 ‘시작’이다.
새로운 인력을 조직에 투입한다는 건, 단지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규 입사자는 적응과 내재화에 시간과 리더 리소스를 소모한다.
신규 인력이 기존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실무에 안착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의 전략화 기간이 필요하다.
조직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만 확장하면, 기존 구성원과의 충돌·혼란·책임 공백이 반복된다.
채용은 구조가 준비되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구조 없이 채용을 진행하면, 사람은 더 늘어나지만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 탓’을 시작하게 된다.
3) 시스템 개선만으로도 채용은 필요 없을 수 있다
많은 스타트업에서 놀라운 사례는, 사람을 뽑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고객문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껴졌을 때, 새로운 CS 인력을 뽑는 대신 반복되는 문의를 FAQ 시스템과 챗봇으로 자동화함으로써 동일 인력으로 두 배의 응답률을 달성한 사례
업무 리포트 작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팀을 추가할 계획이었지만, Notion 템플릿과 슬랙 자동화 봇을 적용해 팀을 증원하지 않고도 효율을 높이는 방식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은 종종 시스템이 없다는 뜻이다.
구조화되지 않은 업무 흐름, 중복되는 확인 절차, 투명하지 않은 정보 공유 방식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성과는 사람의 숫자보다 일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 Insight Summary
스케일링은 구조 없이 가능하지 않다. 더 많은 인력은 반드시 더 큰 구조적 비용을 수반한다.
초기의 성공 공식은 팀이 커질수록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된다.
채용보다 먼저 설계되어야 하는 것은 일의 구조와 실행의 흐름이다.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사람보다 구조에 달려 있다.
“If more people make less progress, it’s not a people problem. It’s a structure problem.”
더 많은 사람이 더 적은 성과를 낸다면, 사람보다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 References
[1] "The scaling paradox: Why elite startups abandon their winning formula", 2023
[2] 노암 와서만, 『창업자의 딜레마(The Founder's Dilemma)』, Harvard Business School
